연계, 숙맥, 주착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쓰거나 잘못된 표현이 굳어진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녹아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맺어진 약속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린 남자형제를 일컬을 때 우리가 흔히 '삼촌, 외삼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삼촌(三寸)'은 그들과 나의 촌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명칭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숙부(叔父), 외숙부(外叔父)' 또는 '작은 아버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 간에 이미 맺어진 약속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움은 내 삶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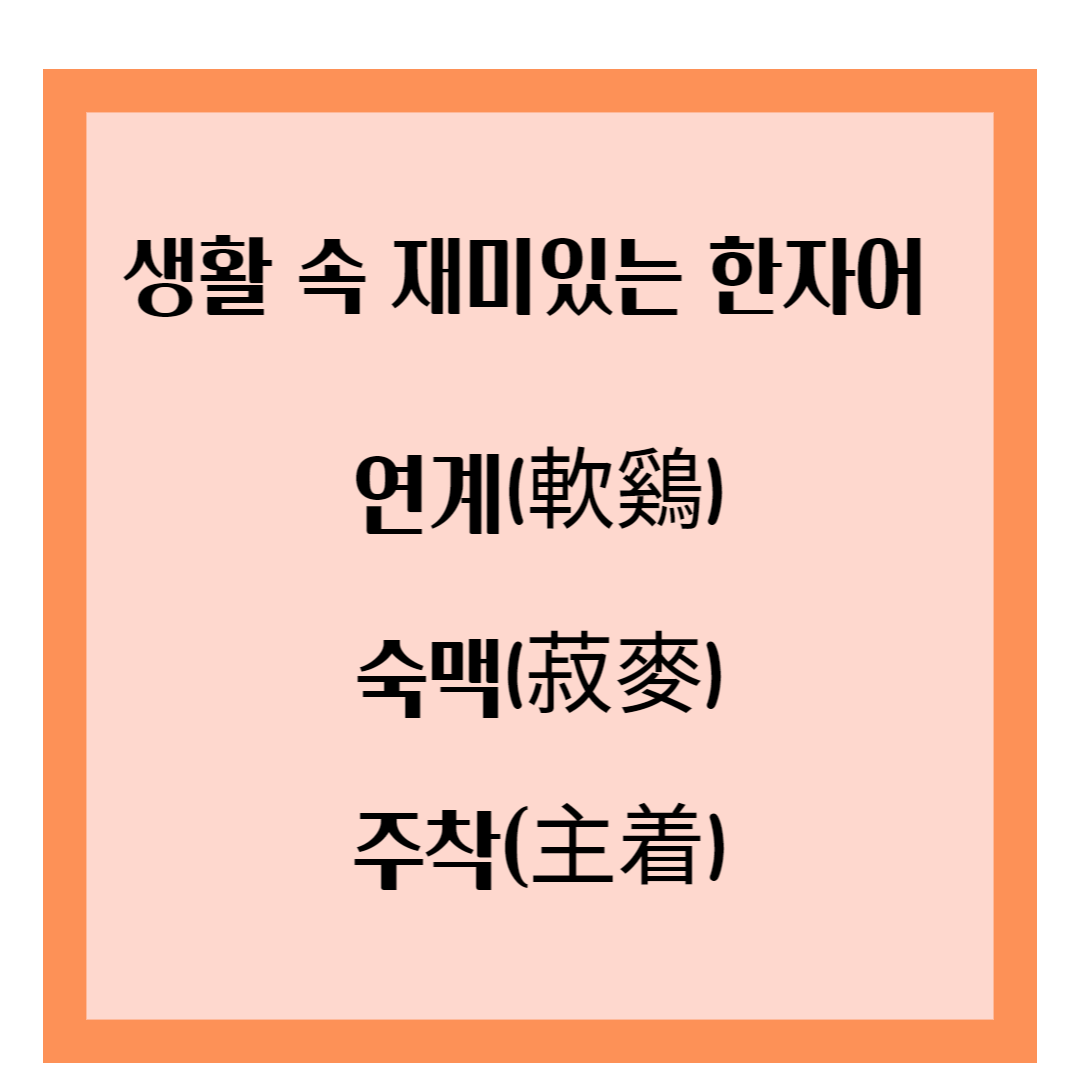
삼계탕에는 영계가 최고지
6월에서 7월 사이에 삼복(三伏)이 있습니다. 삼복의 '복(伏: 엎드릴 복)'은 사람이 개처럼 엎드린다는 뜻의 한자로 여름철 불기운에 가을의 쇠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는 의미로 '삼복'이라고 했습니다. 삼복에는 여름의 무더위에 쇠해진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몸을 보양하기 위한 음식을 먹는데 가장 인기있는 건강식은 단연 '삼계탕(蔘鷄湯)'일 것입니다. 삼계탕은 '어린 햇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을 넣어 끓인 탕국'이라는 뜻입니다. 또 흔히 '영계백숙'이라고 할 때 '백숙(白熟)'은 양념을 하지 않고 하얗게 푹 삶아 익힌 음식을 뜻하며 여기서 '영계'가 한자로는 바로 연계(軟鷄: 살이 연한 어린 닭)입니다. 이 '연계'가 변하여 현재 우리는 '영계'라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영계'를 'young+鷄'로 '어린 닭'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영계'는 나이가 어린 이성(異性)을 속되게 이르는 비속어(卑俗語: 격이 낮고 속된 말, 상스러운 말)입니다. 말이란 생각의 거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을 제쳐두고 굳이 상스러운 말을 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비속어인 '영계'라는 표현을 바로 잡아 올 무더위에는 '영계백숙'이 아닌 '연계 백숙'으로 몸보신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쑥맥? 숙맥?
'쑥맥'이 맞을까요, '숙맥'이 맞을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을 이를 때 '쑥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쑥맥'은 '숙맥'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숙맥(菽麥)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콩과 보리'라는 뜻입니다. '콩과 보리'가 왜 어리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을까요? 숙맥은 '숙맥불변(菽麥不辨)'에서 나온 것으로 이 성어는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콩인지 보리인지도 모른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숙맥불변'을 다 말하기는 너무 길고 번거로워 '숙맥'으로 줄이게 되었고 이것이 어리숙한 누군가를 놀리는 말이 되다 보니 된소리 발음으로 변하여 흔히 '쑥맥'이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속담 중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자로 바꾼 것이 '목불식정(目不識丁)'입니다. '고무레를 보고도 정(丁) 자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무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콩이든 보리든 기역이든 모르는 것은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 지혜를 지닌 사람이 더 간절히 되고 싶은 오늘입니다.
주책바가지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실없는 사람에게 '주책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듭 실수하는 사람에게 '주책바가지'라며 놀리듯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책'의 '주'가 '酒(술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책'은 사실 '주착(主着)'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착(主着)'은 자신의 주관, 뚜렷한 주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착'이 '주책'이 된 것은 모음의 발음이 변한 것으로 이미 이 모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책’은 ‘主着’에서 왔으나 ‘주책’으로 굳어졌으므로 ‘주책’을 표준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착'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주책맞다'가 아니라 '주책없다'로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주책없는 것' 즉 '자신의 주관이 없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너무 물러서 맺고 끊음이 잘 되지 않을 때 '우유부단(優柔不斷)' 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유부단'한 것과 '주책없는' 것이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책'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니 주책없는 사람을 보면 "어휴, 주책맞네"가 아니라 "어휴, 주책없네"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말이란 것도 습관이니까요.
'한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 속 재미있는 한자어 8(紅一點) (1) | 2023.05.18 |
|---|---|
| 생활 속 재미있는 한자어 7(悲哀, 杞憂, 老婆心) (1) | 2023.05.17 |
| 생활 속 재미있는 한자어 6(膝下, 不肖, 反哺鳥) (1) | 2023.05.05 |
| 생활 속 재미있는 한자어 5(肝膽, 寒心, 斷腸, 換腸) (2) | 2023.05.03 |
| 생활 속 재미있는 한자어 4(口舌數, 橫說竪說, 流言蜚語) (1) | 2023.04.28 |


